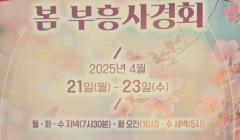[역사되짚기] 김밥, 전래 식품일까?
작성 : 2004년 02월 10일(화) 00:00 가+가-
한국식 패스트푸드 음식의 품목 1호는 김밥이다. 이제는 많이 퇴색했지만 아이들이 학교 행사 중 가장 즐거워 했던 소풍 음식 1호도 김밥이다.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요즘은 길거리에 채이는 것이 김밥집일 정도다.
어떤 사람들은 김밥을 한국 전래의 음식이 아니라고 한다. 해초를 즐기는 일본인들이 만들어 먹던 김초밥이 원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속에도 정월 대보름날 밥을 김에 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속설이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밥에 여러 가지 고명을 넣어 반찬 없이도 먹을 수 있게 한 김밥은 일본의 김초밥에 영향을 받았지만 맨밥에 김을 싸서 먹는 김밥은 전래의 식품이었다고 생각된다.
음식으로서 김을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 때인 1424년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 나온다. 또 1611년 편찬된 '도문대작(屠門大嚼)'에서는 김을 해의(海衣)라 하고 "남해산보다는 동해에서 건져올려 말린 것이 가장 좋다"고 적어 놓았다. 따라서 조선 초에 이미 김을 토산품으로 하는 지방이 있었고 중기에는 각지에서 김을 생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김 양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수산물 양식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김 양식.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어떤 계기에 의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으며, 그 시원에 관한 설은 모두 '썰'일 뿐이다.
하동 지방에 구전되는 얘기는 이렇다. 섬진강 하구에 나무토막이 떠내려 오고 있었다. 이것을 한 노파가 발견했는데, 거뭇거뭇한 것이 잔뜩 달라붙어 있었다. 무엇일까 궁금했던 노파가 나무토막을 건져보니 김이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노파가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섶을 세워 김을 양식했는데 이것이 널리 퍼져 김 양식이 시작되었다.
이 전설속의 노파는 18세기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백년 전쯤의 사람이라고 한다. 또 그보다 앞서 17세기에 지방 순시차 나온 관찰사의 수행원 중 하나가 김을 양식해 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하동과 붙어 있는 전남 광양의 태인도에는 또 다른 전설이 전해진다. 이 전설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김여익이라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김을 양식해야겠다고 깨닫는 과정은 하동의 전설과 비슷하다. 해변에 떠내려 온 참나무에 김이 잔뜩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김 양식을 생각해 냈다는 것이다. 이 전설 역시 18세기 초의 얘기다.
이런 전설을 토대로 1908년에 나온 '한국수산지'는 한국의 김 양식이 남해안에서 대략 18세기 초에 시작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정설로 택하든 대략 18세기 초 여름에 시작되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초기의 김 양식은 주로 대나무 등의 나뭇가지를 세워서 양식하는 방법을 썼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 완도군 장용리에 사는 한 어민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설치해 놓은 어전(漁箭, 큰 나무로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설치하고 대, 갈대, 싸리나무 등으로 만든 발을 지주대와 지주대 사이에 가로지른 것)의 발에 김이 달라붙은 것을 보고 착안해 발로 된 양식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
김에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현대인이 걸리기 쉬운 병을 미리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해초를 좋아하지 않는 미국인들은 김밥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영양 만점의 해초를 맛있게 먹는 법을 익혔다. 그리하여 김 양식과 더불어 대량 생산이 시작된 김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최고 인기 품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윤광룡 기자 yong8128@chollian.net 기사 더보기
윤광룡 기자 yong8128@chollian.net 기사 더보기
어떤 사람들은 김밥을 한국 전래의 음식이 아니라고 한다. 해초를 즐기는 일본인들이 만들어 먹던 김초밥이 원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속에도 정월 대보름날 밥을 김에 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속설이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밥에 여러 가지 고명을 넣어 반찬 없이도 먹을 수 있게 한 김밥은 일본의 김초밥에 영향을 받았지만 맨밥에 김을 싸서 먹는 김밥은 전래의 식품이었다고 생각된다.
음식으로서 김을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 때인 1424년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 나온다. 또 1611년 편찬된 '도문대작(屠門大嚼)'에서는 김을 해의(海衣)라 하고 "남해산보다는 동해에서 건져올려 말린 것이 가장 좋다"고 적어 놓았다. 따라서 조선 초에 이미 김을 토산품으로 하는 지방이 있었고 중기에는 각지에서 김을 생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김 양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수산물 양식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김 양식.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어떤 계기에 의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으며, 그 시원에 관한 설은 모두 '썰'일 뿐이다.
하동 지방에 구전되는 얘기는 이렇다. 섬진강 하구에 나무토막이 떠내려 오고 있었다. 이것을 한 노파가 발견했는데, 거뭇거뭇한 것이 잔뜩 달라붙어 있었다. 무엇일까 궁금했던 노파가 나무토막을 건져보니 김이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노파가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섶을 세워 김을 양식했는데 이것이 널리 퍼져 김 양식이 시작되었다.
이 전설속의 노파는 18세기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백년 전쯤의 사람이라고 한다. 또 그보다 앞서 17세기에 지방 순시차 나온 관찰사의 수행원 중 하나가 김을 양식해 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하동과 붙어 있는 전남 광양의 태인도에는 또 다른 전설이 전해진다. 이 전설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데 김여익이라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김을 양식해야겠다고 깨닫는 과정은 하동의 전설과 비슷하다. 해변에 떠내려 온 참나무에 김이 잔뜩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김 양식을 생각해 냈다는 것이다. 이 전설 역시 18세기 초의 얘기다.
이런 전설을 토대로 1908년에 나온 '한국수산지'는 한국의 김 양식이 남해안에서 대략 18세기 초에 시작되었다고 적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정설로 택하든 대략 18세기 초 여름에 시작되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초기의 김 양식은 주로 대나무 등의 나뭇가지를 세워서 양식하는 방법을 썼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 완도군 장용리에 사는 한 어민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설치해 놓은 어전(漁箭, 큰 나무로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설치하고 대, 갈대, 싸리나무 등으로 만든 발을 지주대와 지주대 사이에 가로지른 것)의 발에 김이 달라붙은 것을 보고 착안해 발로 된 양식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
김에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현대인이 걸리기 쉬운 병을 미리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해초를 좋아하지 않는 미국인들은 김밥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영양 만점의 해초를 맛있게 먹는 법을 익혔다. 그리하여 김 양식과 더불어 대량 생산이 시작된 김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최고 인기 품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